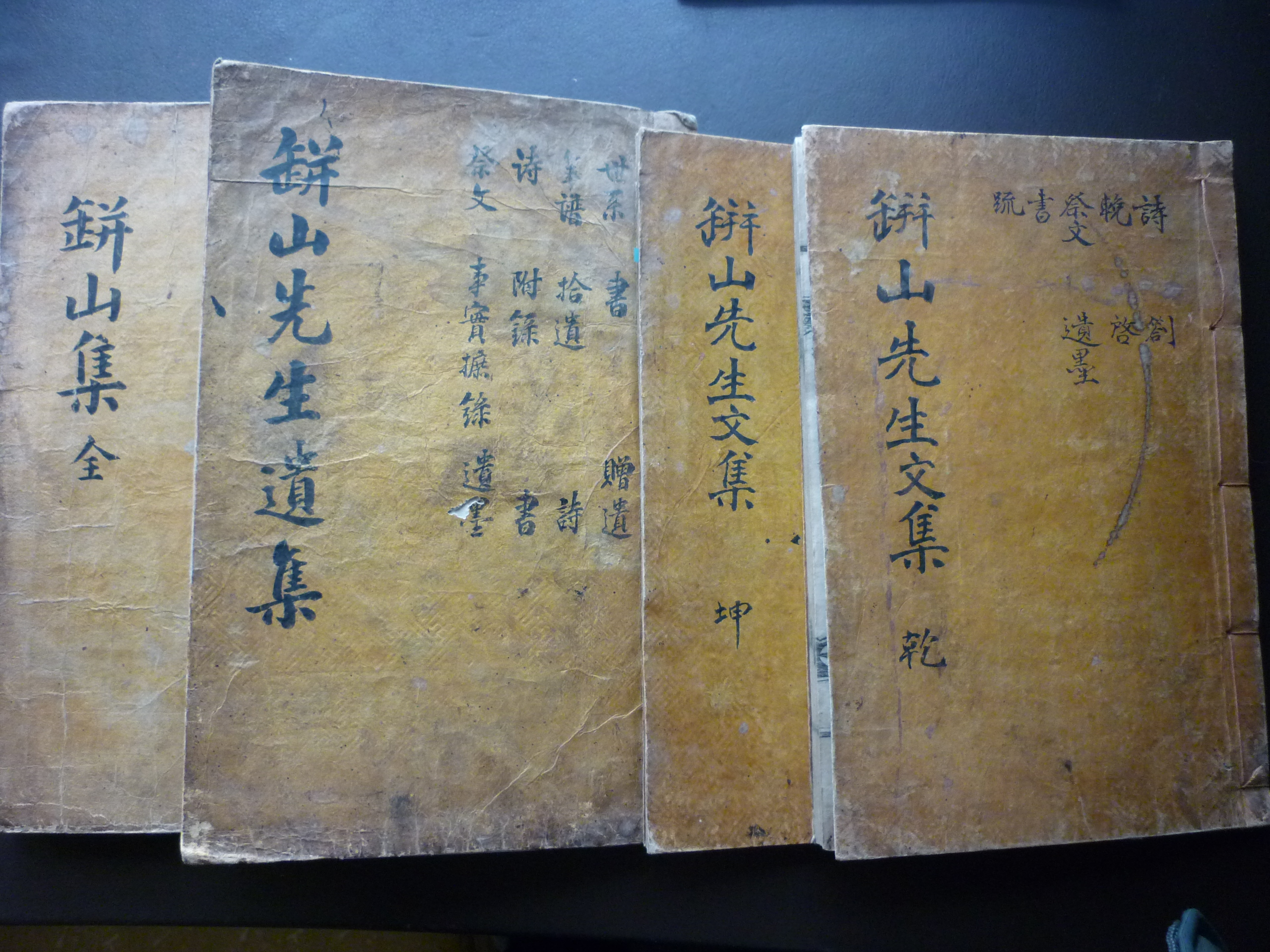요시다 긴슈(吉田金壽)는 에서 “ 람포연은 해동제일의 간박미(簡朴美)가 있다 ”하였다. 간박미는 간결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말한다. 이 도서는 250부 한정판으로 간행하였으며 성대경(成大慶)에게 증정된 10번째 판본이다. 는 요시다 긴슈가 조선의 도자기 떡살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인에게 시문을 받은 도서이다. 떡살 하나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시문 한편으로 감상을 적었다. 백자연화문병, 백자화문면취병, 백자이화문병, 백자철사화문병, 배자화문철회병, 백자장방기하문병, 흑유절목문병, 백자염부절목문병, 흑유장방화절목문병, 백자원심문병, 백자옥근문병, 백자추상문병, 서정주, 김억, 김소운, 김윤황, 김동명, 이하윤, 박영희 등이다. (振衣千仞崗 濯足萬里流)